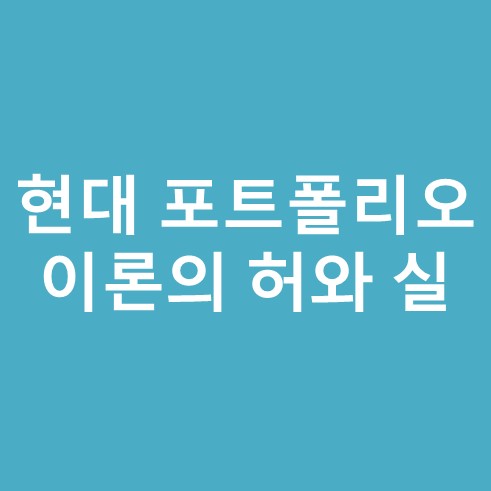여기 바보가 되버린 천재들이 있다. 바로 분산투자를 주장하며 포트폴리오를 얘기하는 자들이 그들이다. 잉? 원래 분산투자 포트폴리오 관리가 정석 아니에요? 라고 묻는 투자가들이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러한지 이제 좀 더 명확히 알아보자.)
한번 잘못 채운 단추는 연속해서 잘못 채운다. 그 해답의 실마리를 끊임없이 엉뚱한 곳에서 찾는다. 이 웃지못할 해프닝이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제 우리는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 어떻게 대중속으로 숨어 들어가는지, 더 나아가 그들 스스로 대중 그 자체(!)가 되려는 피눈물 나고 우스꽝스러운 노력의 과정을 생생히 지켜보자.
가격변동이 기업가치가 나타나고 실현되는 현상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격변동은 도저히 풀수없는 수수께끼이며 앞이 안보이는 미궁속이다.
도저히 알수없는 대자연의 불가사의(가격변동) 앞에 그들은 드디어 기우제를 올리기 시작한다.
본질이 아닌 현상에 집착함으로 발생하는 풀수없는 불가사의, 그에 대한 두려움, 현상에서 답을 찾으려는 천재들의 애처로운 몸짓들. 그 결과 그들은 바보가 되어 버렸다.
(하나의 예를들면 피터 번스타인이 쓴 “리스크”란 책은 인간이 리스크(위험)에 대항하며 발달해 온 리스크의 역사와 의의를 설명해 주는 것에는 최대의 역작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저 담담하고 평이하게 역사를 서술할 뿐이다.그것을 해석하고 있지는 못하다.
“리스크”란 책 안에는 본질에 접근하는 사람과 현상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다. 그리고 그것을 골라낼 생각도.그럴 능력도 없다. 그래서 그는 안타깝게도 책의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생각들을 유추해 내는 실수를 하고 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의 허와 실의 역사
기업가치가 표현되는 현상중 하나인 가격변동을 쫓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점은 무엇일까? 바로 ‘가격 변동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리스크 관리인 것이다.
기업가치를 어떻게 유추해내고 어떻게 올바로 판단해 낼것인가가 아닌 그저 가격변동에 대항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공통된 고민점이다.
첫번째 단추를 잘못 채움으로 인해 이제 두번째 단추가 잘못 채워진다. 바로 1952년 해리 마코비츠라는 대학생은 14 페이지 분량의 원고를 기고한다.제목은 < 포트폴리오 선정 > 이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주식은 요즘의 우리처럼 무분별하며 투기적인 형태로 거래되고 있었기에 그의 기고는 세상관심에서 사라졌다.
1959년 마코비츠는 자신의 이론을 더욱 보강하여 < 포트폴리오 선정: 효율적인 분산투자 >란 논문을 발표한다.
주 내용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그 차가 얼마나 큰가를 측정하여 위험도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분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장상황에 따라 보유종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종목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적절히 분산, 분배하면 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한도로 줄일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두번째 잘못된 단추가 완전히 채워졌다.)
즉, 결론은 효율적으로 분산하여 투자하는 “분산투자”를 하자. 이것이 마코비츠의 요점이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 포트폴리오의 시조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논문은 시장의 투기적 거래속에 자신의 미래의 지지자들에게서 조차도 주목받지 못하고 만다.
그로부터 다시 15년이 흘렀다. 1973년 ~74년 사이에 닥친 이유없는 하락. 이것은 시장의 가격변동을 쫓는 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왜? 하락하는가? 알수 없는 하락, 가격변동. 이것은 그들에게 알수없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물론 1929년 대공황 당시의 하락이 있긴 했지만 당시는 “공황”이란 상황으로 그러했다고 그들은 판단하고.위안했기에 그냥(!) 넘어갔지만 공항도 아닌 1973년의 하락을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었고 결국 하락에 대한 공포가 만연하기 시작한다.)
(이에 대해 워렌 버펫은 당시의 하락을 가격변동을 쫓는 자들이 자기들끼리의 자기혼란에 빠져 만들어낸 혼란이라 생각하고 있다. 가격변동을 쫓는 자들이 경쟁적으로 만들어 낸 하락공포(심리적 페닉현상)가 73,74년이고 이 하락은 지수를 40% 가까이 하락시키며 모든 투자가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갔다. 그러나 워렌 버펫은 이 하락을 신이 주신 최대의 선물이며 최대의 매입시기라고 주장하였다.)
똑같은 하락을 보고 버펫은 기업가치의 변화없이 진행되는 이 하락은 절호의 매입시기라고 해석하였고 다른 한편은 다르게 해석하였다.
즉, 하늘에 기우제를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가격변동을 쫓는 자들은 어떻게 기우제를 올릴가를 연구하기 시작하며 과거의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15년전에 발표된 마코비츠의 < 포트폴리오 선정: 효율적인 분산투자 >란 논문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된것이며 마코비츠는 그들의 지지자들을 15년후에 만나게 된 것이다.
가격변동을 따르는 자들이 또 뒤지기 시작하여 찾아낸 것이 마코비츠의 제자 “샤프” 였으며 이제 그들은 세번째 잘못된 단추를 채운다. 그것이 샤프가 1963년 주장한 베타이론이다. (샤프, 베타 등등 아마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들이 여기서 등장하기 시작한다.)
1963년 샤프는 베타요소(beta)란 것을 만들어 낸다. 시장의 주요한 요소는 주가지수, 국민총생산(GNP), 물가지수 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측정하여 이것을 수치로 측정하면 가격변동의 정도를 알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베타값이며 주식시장과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하게 움직이면 beta값은 1 이 된다. 1 이 되면 시장의 가격변동 만큼 동일하게 움직인 것이며 베타값이 2 가 되면 시장보다 두배 더 움직인 것이며 0.5가 되면 시장에 절반만큼 움직인 것이다.
시장내의 위험도(베타값)에 시장밖에 존재하는 기업의 서로 다른 특성을 적절히 분산, 배분, 첨가한다. 이것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그러면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완성된다는 것. 이것이 샤프의 이론이다.
즉, 그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는 시장이 10% 상승하면 자신의 포트폴리오도 10% 오르고 시장이 20% 하락하면 자신의 포트폴리오도 20%가 하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한국으로치면 종합지수만큼 움직이는것 그것이 현대의 포트폴리오이다.)
가격변동의 그 폭과 비율만큼 똑같이 움직이려는 것. 어떻게 가격변동 만큼 완벽하게 동일하게 움직일수 있는가. 그것이 효율적 포트폴리오 이다. (어처구니없게도 피터 번스타인은 샤프의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가장 완벽한 포트폴리오라고 칭찬하기까지 하였다.)
🔰 함께 보면 좋은 글